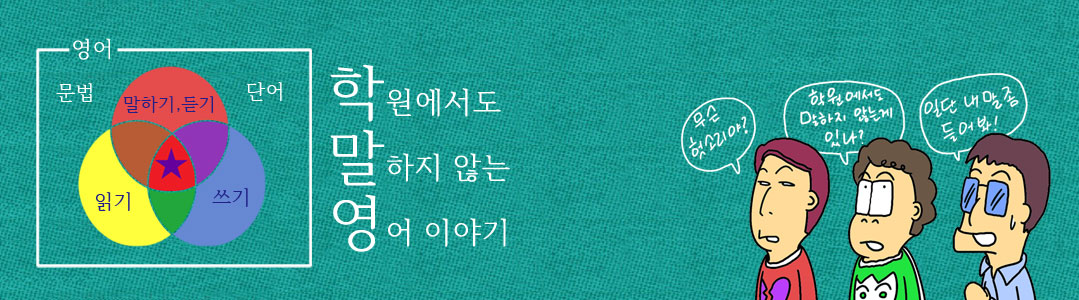[토익, 회화용]발음에 국적이 어딨니?
발음에 국적이 어딨니?
미국식, 영국식, 호주식
토익 듣기 문제에는 국가별로 발음이 구분되어 있다. 원래는 미국식 발음만 나왔지만, 대략 10년 전, 좀 더 현실적인 듣기를 위해 영국식과 호주식이 추가되었다.
그런데, 이런 시험 방식이 심각한 부작용도 불러 일으켰다. 대표적으로, ‘영국식 발음은 미국식보다 어렵다’는 것이다. 실제로, 토익에 영국식 발음이 최초로 추가될 당시에 듣기가 훨씬 어려워진다는 소문도 나돌았다.
웃기는 소리다
난 호주의 농장에서 만났던 다국적인 4명의 친구들과 ‘피지(Fiji)’로 여행을 떠난 적이 있었다. 그 때 당시는 남태평양 하면, ‘피지’라는 말이 바로 떠올려질 정도로 한국인들에게 가장 각광받는 여행지였다.
* 영화, ‘트루먼쇼’에서는 주인공 짐 캐리가 간절히 가고 싶은 꿈의 장소로 표현된다.
다국적 친구들과 여행을 하다 보니, 특이한 점도 한 가지 있었다. 한국인은 전혀 볼 수 없고, 다국적의 사람들만 보게 된다는 것이었다. 세계화 시대에 발맞춰, 나는 이미 글로벌 인재가 된 듯한 착각이 들었다.
* 한국인을 볼 수 없다? 현지에서 모든 것을 즉흥적으로만 해결하면 발생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한국인들은 자유여행이라 해도, 숙박 정도는 예약 하고 출발하는 편이다.
아쉽게도 나의 영어 실력이 문제였다. 숙소나 여행지에서 만나는 다른 여행객들과의 대화에 쉽게 낄 수가 없었다. 함께 여행 하는 친구들은, 1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원어민처럼 대화가 가능한 수준이었고, 피지에서 만났던 여행객들은 유달리 미국인, 영국인들이 많았다. 대화의 속도가 상대적으로 더 빨라질 수밖에 없었다.
* 함께 여행한 친구들의 국적 - ‘영국인 1명, (영어를 아주 잘하는) 독일인 1명, (영국 이중국적을 가진) 남아공인 1명, (내 영어 수준과 비슷한) 이탈리아인 1명’
→ 친구들끼리만 대화를 할 때는 서로를 잘 알고 있어서 배려란 것을 한다. 내 수준에 맞춰서 대화의 완급조절도 가능하다. 하지만, 처음 만난 여행객들은 그런 것을 전혀 알 수가 없다. 이런 상황에서는 완전히 고립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영국인 2명과 대화를 하게 되었을 때였는데, 내가 고개를 끄덕이며 웃고 있었다. 대화에 끼어들어 서로 말을 주고받는 나의 모습까지 보게 되었다. 그런데, 더 이상한 것이 한 가지 있었다. 둘 다 영국인인데, 유독 한 명의 말만 더 선명하게 들리고 있었다.
런던 사투리
“너가 하는 말은 왜 이렇게 잘 들리니?”
나는 궁금한 나머지 직접 물어봤다.
“나는 여왕의 말을 쓰거든.”
그는 자랑스러워하는 목소리로 이야기했다.
런던에는 영국 왕실을 주변으로 형성되어 있는 동네가 있다고 한다. 정확하게 말은 하지 않았지만, 상당히 품격 있는 귀족층(?)이 살고 있는 곳처럼 표현했던 것으로 기억한다. 그 여행객도 그런 삶을 살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말을 할 때의 목소리에는 미묘한 힘이 들어가 있었다. 그리고, 같은 런던이라고 해도 억양이나 발음이 다르다는 말을 덧붙였다. 런던의 동쪽(East London)은 상대적으로 서민층이 살고 있는 지역으로 발음이 좀 더 투박하고 강한 악센트(accent)를 갖고 있다고 설명해 주었다. → 영국말은 무조건 어렵다고 느끼고 있었던 나의 생각은 착각이었다.
이것은 여러분도 직접 느껴볼 수 있다. 한국에서도 흥행했던 ‘러브 액츄얼리(Love actually)’의 제작사인 워킹 타이틀(Working Title)의 영화들을 감상해 보는 것이다. 일반적인 할리우드 영화보다 훨씬 잘 들린다!
* 영화에서 사용되는 영어가 여왕이 사용하는 발음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다. 그냥 잘 들린다. 내가 감상한 이 제작사의 가장 최근 작품은 ‘어바웃 타임(about time)’이었다.
→ 역시나 발음이 선명하다.
미국식 = LA 사투리
일반적인 한국인이 알고 있는 ‘미국식 발음’이란 것은 LA 지역, 즉 캘리포니아 지방의 사투리다. 한인 거주밀도가 가장 높은 지역인 만큼, 한국인들이 접하게 될 확률이 높은 발음인 것은 당연하다. 할리우드 영화가 제작되는 곳도 LA라 그 지방의 발음을 ‘미국인’들이 모두 사용하는 것처럼 착각이 되는 것이다.
* “와, 영어 발음 좋은데?” 한국인이 이런 말을 듣는다면, 대부분 LA 지역의 발음을 구사할 확률이 높다.
뉴욕식 사투리는 영국식에 가깝다
2007년이었다. 영어 회화 열풍과 함께 한국에도 미드 붐이 일었다. ‘석호필’이라는 이름을 유행시킨 ‘프리즌 브레이크’가 중심이었는데, 호주에 다녀온지 얼마 안 된 만큼 영어에 대한 감(感)을 잃지 않기 위해 재미있는 미드라면 닥치고 감상했다.
그런데, 이상했다. 자막이 없이도 쉽게 들리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듣기조차 힘든 경우도 있었다. 기본적으로는 나의 영어실력이 문제겠지만, 냉탕과 온탕을 오가는 것처럼, 듣기 실력이 들쑥날쑥한 게 너무 황당하게 느껴졌다. 이유가 뭘까?
내가 즐겨보는 미드를 보던 중이었다. 유독 잘 들려서 3회부터는 자막 없이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느껴지는 게 있었다.
이야기의 중심은 ‘뉴욕’이었다.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았다. 내가 가장 좋아하는 시트콤도 주무대가 ‘뉴욕’이었는데, 주인공들의 발음은 역시나 잘 들렸다.
사실은, ‘미국식 발음’이란 것 자체가 넌센스(nonsense)다. 미국 자체 내에서도 다양한 사투리가 존재한다. 당연히 좀 더 잘 들리는 발음과 아닌 것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
재미있는 점은, ‘뉴욕식 발음’이 음가(音價) 그대로 딱딱 끊어서 발음하기를 선호한다는 것이다. 즉, 영국식과 가장 유사하다는 의미다. 유럽에서 배로 대서양을 횡단할 시에, 미국의 관문 역할을 했던 ‘뉴욕’이 영국식 발음과 연관성이 깊은 건 어찌보면 당연한 이치다.
[주의] 전문적인 용어가 많이 나오는 범죄수사물, 메디컬, 전문직종(변호사, 월스트리트) 미드는 미국 사투리와 상관없이 어렵다. 이런 미드는 제외하고 설명하는 내용임을 주의하세요.
톰 크루즈 vs 매튜 맥커너히
뉴욕 발음이 어떤지는 영화배우를 통해서 쉽게 알 수 있다. 난, 텍사스가 주무대인 ‘인터스텔라’를 볼 때, 주인공인 ‘매튜 맥커너히’의 발음이 상당히 거슬렸다. 뭔가 모르게 흐물흐물하면서 어물쩡 넘어가는 느낌이라고 해야할까? 명확하지 않은 발음으로 듣기가 쉽지 않았다.
이에 반해 톰 크루즈의 발음은 항상 선명하게 들렸다. 어떤 영화를 봐도 이것은 변함이 없었다. 그래서, 고향을 찾아봤다.
톰 크루즈(미국 뉴욕주), 매튜 멕커너히(미국 텍사스주)
여러분이 직접 확인해보기 바란다. 개인적인 느낌이지만, 여러분도 비슷하게 판단할 확률이 높을 것이다. * ‘유튜브 짤’로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포인트>
미국식 발음이 잘 들린다?
완벽한 착각이다. 그렇다고 영국식 발음이 더 잘 들린다고 말하고 싶지는 않다. 사람마다 다르고, 같은 나라에서도 지역마다 다르다.
→ 발음에 선을 긋지 말자.
'수능&토익&회화용 > 2017 영어공부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 [토익용]배울 수 있는 것과 배울 수 없는 것 (2) | 2017.04.13 |
|---|---|
| [토익용]배울 수 있는 건 part.5.6 밖에 없다. (0) | 2017.04.12 |
| [토익, 회화용]발음도 모르는데 제대로 듣겠다고? (0) | 2017.04.07 |
| [토익용]듣기도 읽기다 (4) | 2017.04.05 |
| [수능vs토익]토익은 숨은그림찾기다 (0) | 2017.04.04 |